-
728x90반응형
한시의 이해를 돕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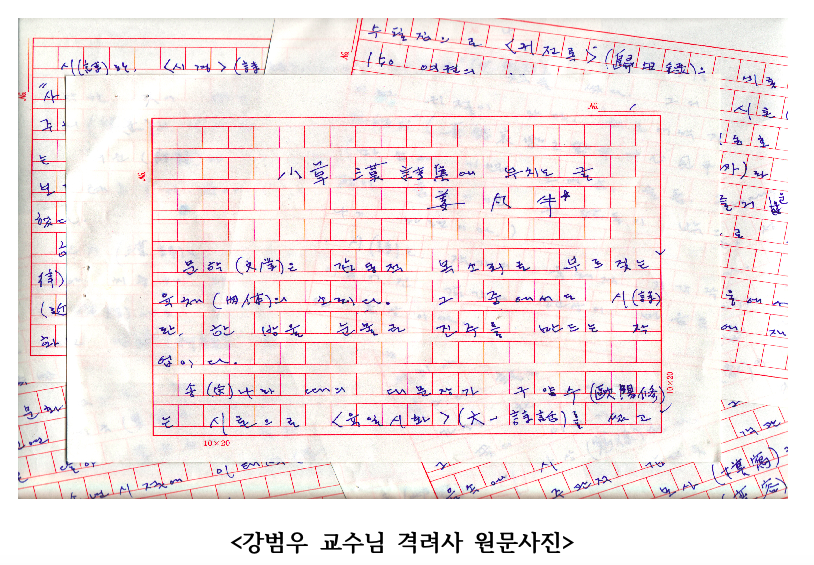
1. 서두언
한시를 언뜻 생각하면 한자를 사용하여 시처럼 쓰인 것이면, 모두 한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 한시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또는 요즈음 현대시의 의미로 볼 때 시라 말할 수 있는 글들과 좁은 의미의 한시와는 그 형식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변해 왔나를 말하려 한다.
모든 시적인 요소를 갖은 글들. 다시 말하면 운문이라 할 수 있는 글들은 대개가 인간의 성정을 순화시키고 아름다운 정서를 끌어내어 서정성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에는 동일하다 하겠다. 그래서 동양시 중의 가장 오래된 원전이라 할 수 있고 유가들이 중시해온 시경을 고시라고 하는데, 시경 서에 보면 詩者人心之感物而形語言之餘라 했다. 뜻을 말하면 시란 인간이 사물에 대하여 느낀 바를 표현한 말의 남음이란 뜻이다.
함축된 표현의 시를 통하여 인성, 사상, 감정, 지식 등을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는 학문의 精이요 불후의 사업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시를 통하여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효용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왕도정치(패도의 반대)를 펴는데, 효과적인 용구로 썼다고 보아야 한다.
2. 근체시의 성립과정
시경의 시들은 당시 여러 지방(당시는 여러 나라)의 가사(노래)들을 모은 것이다.
요즈음으로 말하면 대중가요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간추려 놓은 것이 시경이다. 시경에 시의 형식은 4자씩 문맥을 끊어서 표현한 것이 주가 되나 가끔 5~6자로 된 곳도 섞여있다. 문장의 길이도 대체로 자유롭다고 보아야 하며 노래적인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현의 반복 등이 자주 나타난다. 모시 서(毛詩 序)에서는 특히 국풍(國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떤 왕공들이나 군자의 덕을 기리거나 어느 소인을 풍자하거나 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이 시들을 읽을 때 어떤 시들은 먼저 느껴지는 것이 남녀의 사랑 노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도 많다. 그래서 옛날 사춘기의 젊은 선비들이 시경을 읽다가 요샛말로 말하면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자유로운 듯한 글에도 모두 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운문이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되는 것이다.어쨌든 그 뒤에는 완전 정형화된 4 언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천자문이다. 천자문은 우주, 자연, 인간, 역사, 윤리 등을 총망라한 내용을 담은 250구의 운을 따라 지은 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6 언시, 8 언시, 5 언시, 7 언시 등이 등장하는데 漢代부터 이후 5 언시, 7 언시가 주를 이루게 됐다. 여기서는 5 언시와 7 언시만 가지고 말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시는 운만을 따르고 율이라 할 수 있는 측평을 보지 않은 채 비교적 자유로히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날 고체시라고 부른다.
이것에서 출발한 한시가 근체시의 형식이 본격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한대 이후부터 라고 보아야 하며, 晋나라를 거쳐 당나라에 와서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면 된다.
당나라의 성당시에 이백이나 두보 등도 고체시와 근체시를 섞어 썼다. 그 후로 내려오면서 근체시로 고정화됐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외에도 현대 시적인 요소를 갖는 글들이라 할 수 있는 사(詞)나 부(賦)등도 운문으로 돼 있는 또 다른 형식의 시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대 초나라의 가사라 할 수 있는 초사(楚辭)와 소식의 적벽부 등을 보면, 현대시적은 데가 정형화된 시에서 보다 더 많다고 본다.이 모두를 넓은 의미의 한시라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 좁은 의미의 한시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5 언시나 7 언시의 고체시와 근체시를 말하는 것이고, 더욱 지금에 와서는 근체시만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고조선의 곽리자고 아내 여옥(麗玉)이 지었다는 箜篌引과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었다는 黃鳥歌는 모두 4 언시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시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 이후 당나라에 영향을 본격 받으면서, 일부 고체시도 많지만 장편시가 아니면 대개 근체시로 고정화 되어갔다고 본다. 특히 지금의 한시협회 같은데서는 거의 근체시만을 한시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하려는 한시는 자연히 근체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스님들의 시 중에는 근체시의 형식을 따른 시들도 많지만 선시가 아니더라도 5 언이나 7 언의 형식은 따르고 있으나 기타의 형식들은 뛰어넘어 글자 그대로 무애 자재한 시들을 쓴 분들이 많다.
그러나 유가들에서는 이 형식을 매우 중하게 생각했다. 특히 중국의 명 . 청 시대에는 이 형식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만 해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한시 하면 주로 근체시를 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형식은 오늘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똑같이 지켜지고 있다.
3. 한시의 수량
우리 선조들은 글을 아는 분이면 누구나 한시를 썼다. 한시는 지금의 현대시처럼 시인들이 시를 써서 심사를 받아 등단하여 세상에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아는 사람이면 모두가 한시를 썼다. 그만큼 일반화된 자기표현의 방법이었기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지식 척도, 사상, 성품, 정서, 처지 등이 표현됐기 때문에 한시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인물을 말한다는 것이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대시가 아무리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서점의 한 모퉁이를 메우리 만큼 많다 해도 그 숫자에서 한시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천 년을 두고두고 그 많은 사람이 쓴 숫자를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지금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한시를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고, 아직도 일부 잔존하지만 오늘날 한글세대에서 밀려나 먼 옛날의 얘기 같이 됐고,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치 않고는 역사의 단절이요, 문화의 단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분들은 한시 하면 ‘아~ 시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있다. 그러나 시조와 한시는 표현형식이 다른 장르의 문학이고 옛날 시조는 그 숫자에서도 한시의 몇천분지 일에 해당될 것인 데도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다 보니, 한시는 잘 몰라도 시조는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지금처럼 몇 해 가 지나면 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천년을 배로 하여 이어온 우리의 대표적 지식문화가 이대로 단절되는 일 만은 없어야 하겠다.4. 한시의 구성과 근체시의 작법
한시의 작법에 대하여 대강만 설명하려 한다. 한시는 4 구로 이루어진 것을 절구, 8 구로 이루어진 것을 율시, 그 이상인 것을 배율이라 한다.
우선 시제를 정하고 다음에 운을 붙이는데, 이것을 압운이라 한다. 이 운을 붙일 때 근체시에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체시와 달리 대개 평운을 붙인다. 5 언시에서는 외구 끝에만 압운하나, 7 언시에서는 처음 1~2구에 한해서 내외구 끝에 모두 압운을 하고, 다음부터는 외구 끝에만 압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혹 7 언시에서도 첫 구인 내구 끝에는 압운하지 않고, 외구에만 압운하기도 하고, 5 언시도 내외구 끝에 모두 압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시제에 따라 이 운에 맞추어 시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압운하는 글자는 현재 쓰고 있는 106 운중 반드시 그 운목에 소속된 글자끼리만 압운하게 된다. 혹 통운을 쓰는 경우도 있다. 통운이란 운목에서 통운이 허용된 것에 한해 정 해진 법칙대로 압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흔치 않다.
다음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기는 시작, 승은 이음, 전은 뒤집음, 결은 맺음인데 보통 사물의 실상을 표현하는 것을 경(景)이라 하고, 이를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정(情)이라 한다. 경이 기승이 되고, 정이 전결이 되는 게 보통이다. 또는 정이 기승이 되고, 경이 뒤에 전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율시는 내외구 두구씩 따져 기련(起聯), 함연(頷聯), 경연(頸聯), 미련(尾聯)이라 하는데, 또는 기련을 首聯이라 하기도 하고, 함련을 前聯 또는 撼聯이라고도 하며, 경연을 後聯 또는警聯이라고도 하고 미련을 結聯 또는 末聯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쉽게 12345678구라고 부르겠다. 율시에서는 1,2구 가 기승 구이고, 7,8구가 전결구이며 3,4구와 5,6구는 대구라 하여 반드시 대가 되어야 한다.
대란 글자의 대, 시어의 대, 전체 문장의 대등 다양한데 글자의 대를 설명하자면, 색상, 장단, 경중, 숫자, 방향, 고저, 한 서, 계절 따위 등등이 동류, 또는 반대로 대비해서 쓸 수 있고 시어 일 때는 지명이나 인명, 사물명 기타 등등을 대칭하여 지을 수 있고, 문장의 경우는 표현의 전체 내용이 대칭이 되는 가인데, 비슷하거나 반대일 때가 모두 포함된다. 이상은 고체시나 근체시에 모두 해당된다.다음은 근체시에서 측평(仄平)의 글자를 배열하는 것인데, 즉 평상거입(平,上,去,入)의 4성 중 상거입성을 측이라 하고, 평성은 상평과 하평으로 나뉘는데 모두 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측성을 높다 하고 평성을 낮다고 하여, 고저(高低)라 고도 부르는데 측평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는 것으로 두자가 측성이면 다음은 평성이어야 하고 이렇게 섞어서 글자를 놓는 것이다. 그래서 첫 시작이 평으로 시작되면 평기 측,수자 라 하는데 5 언시에서는 절구나 율시 모두 측기식을 정격(正 格)이라 부르고, 평기식을 편격(偏格)이라 하며 7 언시에서는 반대로 평기식이 정격이 되고 측기식이 편격이 된다.그리고 율시는 이 절구를 똑같이 두 개 겹쳐 놓은 형식으로 짜인다. 즉 측기 식이면 측기식 절구 두 개를 이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1,2,3,4구가 측기로 시작했는데, 5,6,7,8구는 평기로 시작한 것을 이어서 만든 경우의 율시도 간혹 있긴 하다.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상을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반응형